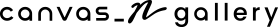Past 농담: 내게서 번져 당신에게 건네는
본문

‘농담(弄談)’이라는 단어에는 상대가 기분 좋기를 바라며 건네는 작은 바람이 담겨있다. 그런가 하면 ‘농담(濃淡)’은 예술에서 색이나 명암의 옅음과 짙음의 정도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캔버스N 갤러리가 준비한 《농담: 내게서 번져 당신에게 건네는》은 바로 이 농담이라는 다의어에 주목했다.
이번 전시는 자신의 고독을 푸른 빛의 농담(濃淡)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타인의 미소와 안녕을 기대하는 3인의 작가, 이정희(b.1988), 이페로(b.1975), 주유진(b.1989)과 함께한다. 전시는 마치 농담이 번지듯이 혹은 농담을 건네듯이 펼쳐질 것이다.
진하게 번져가는 ‘나’
첫 공간에는 작품마다 다양한 농담의 푸른빛이 고여있다. 이 공간에 구성된 이정희와 주유진 두 작가의 작품들은 특히 제목이 인상적인데, 공통적으로 일기의 한 구절을 발췌하여 작품에 제목을 붙인 까닭이다.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두 작가의 작품들은 저마다의 고독을 논한다.
먼저 이정희 작가의 작품에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 인물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은 채 저마다의 행위를 한다. 물속에 침잠해 있기도 하고 누워서 자거나 사색에 잠긴 인물들은 모두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고립된, 여전히 고독한 현대인들의 초상이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하나 혹은 두 개의 강렬한 색이 작품을 지배한다. 작가는 색의 다양함을 제한하지만 색의 농담 조절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풀어놓는다. 이와 같은 색의 제한은 평소에 기억하는 사물의 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배경보다도 인물들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작가에 따르면 작품의 배경은 아르카디아(Arcadia)에서 비롯된다. 아르카디아는 세상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을 나누고 노래하는 목동들의 공간으로 서양문화사상 가장 대표적인 전원적 이상향이다. 그러나 영원한 낙원에도 유한한 존재의 죽음은 피해 갈 수 없다(Et in Arcadia ego). 그렇기 때문에 서양 미술사에서 아르카디아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교훈을 주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작가의 아르카디아에는 고독과 좌절, 절망이 공존한다. 현실에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행복들로 사는 것, 그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낙원인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서슴없이 풀어 둔 고독을 통해 비단 혼자만의 경험은 아님을 전하며 작품의 인물들을 통해 잠시라도 휴식하고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주유진 작가의 고독은 어떠한가. 돌가루가 섞여 특유의 질감이 더해져 깊은 심연에 빠진, 혹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인 푸른빛이 화면을 감싼다. 작품의 작은 점경 인물은 푸른색의 무한한 풍경과 고독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누구도 대신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홀로 외롭다. 작가는 필연적이며 숙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 중 하나인 고독에 대해 사유하며 이를 장소화한다. 그러나 캔버스에 작은 존재를 휘감는 푸른 빛의 장소는 상실, 즉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한 고독은 아니다. 삶의 무수한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블루를 통해 작가는 필연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면, 작가는 이 고독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고독이길 바란다. 작가는 외로움이 아닌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그 안에서 소중한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 스스로를 혹은 작품을 보는 관람자를 위로한다.
스치며 건네는
공간을 옮기며 개인의 고독에 대한 사유는 곧 인간에 대한 사유로 번진다. 이페로 작가는 주로 음식과 먹는 사람의 이미지를 담아낸다. 먹는다는 행위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로서 작품의 토대를 이룬다. 이페로는 초기 작업에서 ‘밥상’을 소재로 일상의 텍스트와 서사를 캔버스에 담았다면 최근 작품들은 세밀하게 그려낸 아름답고 달콤한 디저트들을 빠른 스트로크(stroke)로 밀어내 형상을 뭉개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서양화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지만 모든 작동 방법은 동양회화의 가치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과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재빠르게 밀어내어 뭉개버리면 날카로운 선들의 조합이 순간적으로 면과 부분적 가루의 덩어리들로 분화된다. ‘잘 뭉갠다’는 것은 곧 ‘잘 그려진 밑작업’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세’인데, 밀어버리는 큰 붓의 흔적은 곧 작가가 내쉰 커다란 호흡의 흔적이 된다. 우연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이 작업의 결과물은 불가능한 미지의 아름다움과 조우하는 순간이자 기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부드러움과 무너짐, 달콤함과 씁쓸함, 비애와 해학 등의 극단의 관념들이 공존하는 것에 관심을 둔 작가, 그리고 ‘밀어내어’ 모호해진 형상의 작품들은 마치 휴대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Swipe out)’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감출수록 욕망이 더 드러나는 순간을 담는다. 작가는 그려진 대상이 뭉개지고 흐려짐에 따라 오히려 드러내고자 했던 실체가 분명하게 떠오른다고 전한다.
프로이트가 언급한 파괴, 그리고 죽음 충동, 타나토스(Thanatos)와 같이 작가는 일련의 ‘망치는’ 과정을 거쳐 삶을 갈망하는 생명 에너지(Eros)로 다시 탄생시킨다. 잘 망쳐서 완성되는 아이러니, 이페로는 이러한 수행을 반복해 내며 ‘기운생동’을 작품에 담아내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곧 먹는 것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내는 과정이 된다.
미소를 기대하는
마침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유진 작가가 조성한 작은 정원이 펼쳐진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고대부터 마음에 비유되어 현실 세계와 분리된 장소로 여겨졌다. 현실 세계의 시름을 놓고 잘 가꿔진 세계인 정원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은 형형색색의 꽃과 향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꿈같은 공간으로의 진입이다. 만개한 정원의 꽃들을 비롯한 다양한 자극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향기롭게 감싼다.
단조로운 색이 펼쳐졌던 개인의 고독과는 다르게 다채롭게 꽃이 핀 <정원> 연작은 ‘타인의 고독’을 주제로 한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위로하고자 했던 고독은 바로 작가의 어머니가 겪었던 많은 일들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사전적 정의의 처연한 고독에 어머니를 두고 싶지 않은 작가의 마음에서 피어난 정원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단조로웠던 푸른빛의 고독과는 다르게 다채로운 색이 번지는 주유진 작가의 <정원> 연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도 오고, 햇빛도 비추며 바람도 불고, 그 계절에 따라 색색이 꽃이 피고 지는 그러한 정원의 풍경을 갖기를 바라는 위로의 편지다.
물감의 농담처럼, 혹은 상대가 기분 좋기를 바라며 던지는 농담처럼, 전시장 전체를 물들인 작품들은 저마다 개인의 고독을 위로하고, 나아가 타인의 안녕을 바란다.